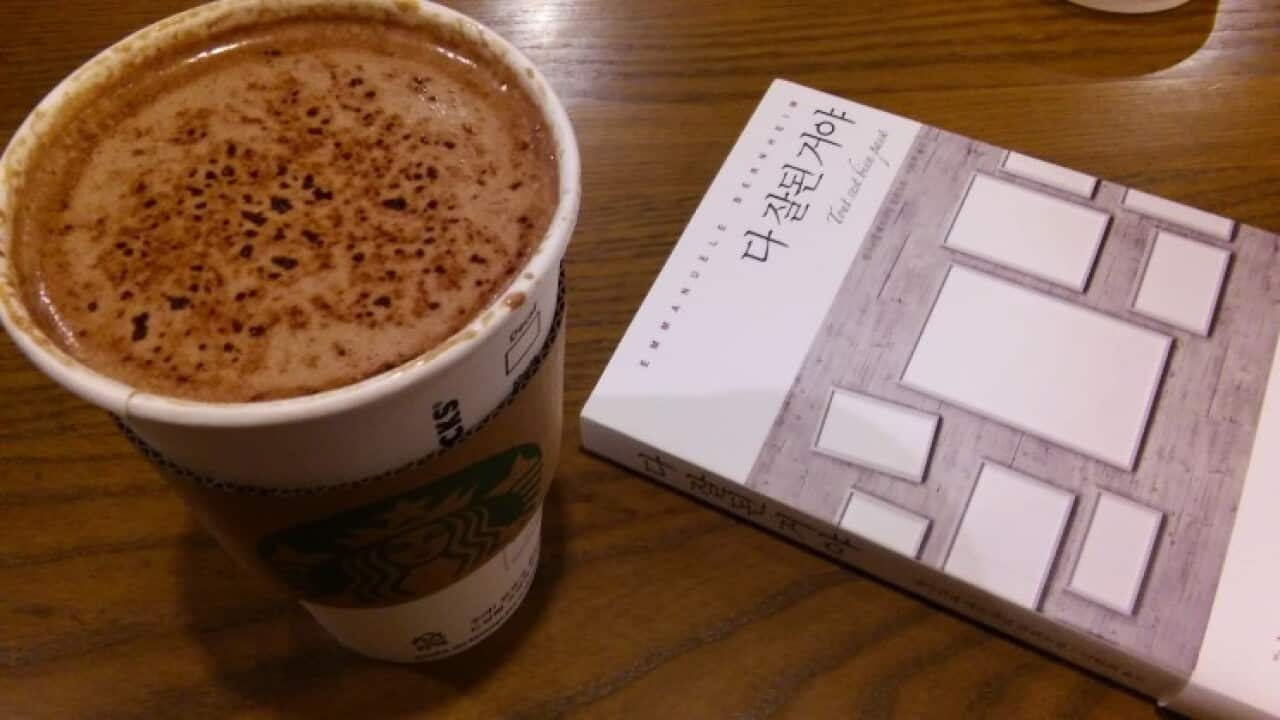소설은 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동생의 연락을 받고 주인공이 병원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기다려야 하는 엘리베이터, 택시 정류장의 긴 줄, 지하철, 불안, 진하게 풍기는 커피 향기……. 병원에 이르기까지 길게 묘사되는 이동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이미 첫 장에서부터 공황 상태에 빠진 주인공의 현재로 빠져듭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건강했고 인생을 즐긴 분입니다. 그런데 뇌혈관 장애로 쓰러지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아버지는 큰 딸 엠마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힘든 생을 끝낼 수 있게 네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아버지는 고통도 싫지만 자신의 반듯한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엠마뉘엘은 거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줄기차게 요구했고, 딸은 결국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안락사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스위스의 한 단체와 연락이 닿았고, 그곳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키며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스위스로 갈 여행 준비를 합니다. 친지들 중에는 당연 심하게 반발하는 이들이 있었고, 엠마뉘엘은 경찰 조사를 받게됩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홀로 앰뷸런스에 실려 국경을 넘습니다. 딸은 아버지 곁을 지키지도 못하고 약속한 당일 다 잘됐어요라는 짤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흔의 아버지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며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안락사에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엠마뉘엘의 아버지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인데, 마지막 물약을 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손으로 들고 마셔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됐음을 알면서도 베르나임은 잘됐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나고, 고통스런 시간을 복기한 소설을 쓰고, 그렇게 온몸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겪은 뒤에야 비로소 그녀는 다 잘된 거야 하고 읊조립니다.
아버지의 안락사라는 견디기 힘든 시간을 1인칭 시점으로 써내려간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이야기처럼 읽게 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디오 북클럽 오늘은 프랑스 작가 에마뉘엘 베르나임의 자전적 장편 소설 그 내면의 갈등을 들여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