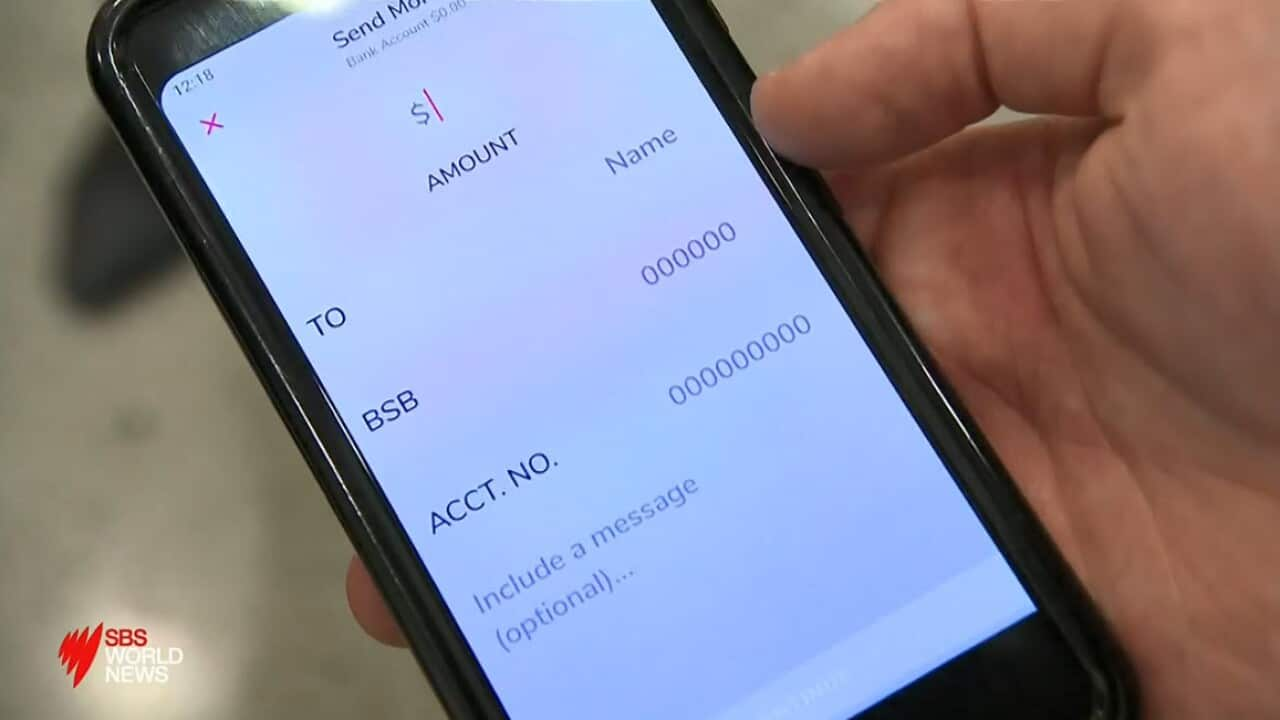박성일 PD(이하 사회자): 오늘도 호주 생활 경제 쉽고 재미있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리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혜리 리포터(이하 리포터): 안녕하세요, SBS 애청자 여러분, 매주 여러분의 생활에 밀접한 경제 뉴스를 가져 오는 강혜리 입니다.
사회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호주와 세계의 네오뱅크 소식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신다고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월초 정식 은행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두 개의 은행, 진자 은행과 86 400은행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두 은행 모두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마케팅 전략과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었죠?
사회자: 네, 진자 은행은 정말 스타트업, 톡톡 튀는 얼리 어댑터 느낌이 컸고, 86 400 은행은 서비스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약간 기존 은행처럼 정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86 400은 상품 내용을 딱 정리해서 공표한 반면에 진자 은행은 기존 선불 카드 고객과 대기 고객 커뮤니티를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공지한 점도 그렇고요.
리포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진자 은행은 호주 금융업계의 반항아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컬트에 비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자 은행은 시작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 만큼 충성도 높은 고객들과의 상호 작용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론칭한86 400 은행에 대해서는 진정한 네오뱅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자: 왜죠?
리포터: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요. 요즘 은행 지점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호주에는 외국 은행이나 지역 은행은 지점이 원래 극소수라서 지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시티 은행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리테일 지점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우체국을 통해 신분 확인을 했거든요. 은행 업무는 인터넷이나 앱으로 하고요.
사회자: 그렇죠. 게다가 이미 많은 은행들이 앱을 선보인데다가 벤디고 은행은 Up, NAB 은행은 uBank란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내놓았죠. 소비자 입장에선 무엇이 네오뱅크인지 혼란스럽긴 합니다.
리포터: 네오뱅크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 듯 합니다. 핀테크, 새로운 금융 테크놀로지가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업계도 만들어졌거든요. 새 기술을 기존 은행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는 업계와 아예 직접 은행을 만드는 업계를 구분을 하게 됐는데요. 직접 은행을 만드는 경우는 기존 은행에 도전한다고 해서 챌린저 뱅크 도전자 은행, 또는 Disruptor 즉 파괴자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회자: 저도 네오 뱅크를 챌린저 뱅크라고 부르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오 뱅크라고 해도 기존 금융법, 은행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잖아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은행들은 기존의 금융업계, 은행들이 은행을 위한 은행들이다. 우리는 고객에게 고객 중심의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은행법을 따르고 규제도 받긴 하지만, 기존 은행들에 대해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사회자: 은행을 위한 은행이라… 사실 얼마전 은행 특검, 로열 커미션 조사 결과를 보면 놀랍진 않네요.
리포터: 네. 그래서 기존 은행의 자본에서 독립적인지 여부를 네오뱅크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진자 은행은 86 400을 소유한 회사(Cuscal)가 벤디고와 마스터 카드에 일부 소유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사회자: 정리하면 86 400은 기술적으로는 네오 뱅크일지 모르지만, 자본 독립적인 면에서는 네오 뱅크가 아니라는 거군요. ‘진자’ 은행만이 ‘진짜’ 네오은행이라는 주장인가요?
리포터: 진자 은행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에릭 윌슨은 진자 은행과 볼트 은행만을 호주의 진짜 네오은행으로 인정합니다만, 사실 많은 경제지들이 기존 은행과 파트너쉽이 있는 디지털 은행들도 네오 뱅크의 범주에 넣어 두곤 합니다.
사회자: 두 은행의 서비스 스타일이나 컨셉에 대한 의문도 여기서 많이 풀리네요. 여기에 대해서 86 400은 어떤 입장인가요?
리포터: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 오스트레일리아(Business Insider Australia)를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영진도 다르고, 은행업 자격증도 다르고, 사무실도 다르다는 거죠. 또한 자신들도 빅 4 은행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빅 4 은행들은 호주 금융의 80퍼센트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이 네오뱅크들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빨리 개발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기술에 따른 금융업의 변화는 필수적 흐름일 것 같은데요.
리포터: 이 부분은 기술 부채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 부채란 IT용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시간은 걸리지만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 빨리 사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나중에 때가 왔을 때 일을 다시 해야 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자: 기존 은행들이 기존 서비스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기술 환경에 적응 하려다 보니, 기술 부채를 떠안게 됐다는 건가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기존 위계 질서가 있다 보니 기술팀 의견 반영이 어렵고, 외주 업체를 사용하게 되면 외주 업체를 가르쳐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차라리 다 엎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자: 이런 문제는 은행 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네요.
리포터: 솔로몬스 자산운용의 신용하 대표이사 역시 기존 은행들이 수입만큼이나 임금이나 지점 관리비 등 지출하는 금액이 많다는 것, 기존 전산 시스템이 신규 기술이 들어간 앱과 연결이 되기까지의 데이터 이전 비용과 시간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처음부터 소비자 뱅킹을 새 시스템에 연결하여 시작하는 네오뱅크들이 신규 기술 적용이나 업데이트 등 제품 개발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죠.
사회자: 그렇군요. 다시 한 번, 4차 혁명이란 말이 피부로 와 닿는데요. 이렇게 호주에서는 지금 네오 뱅크가 시작 단계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리포터: 비즈니스 인사이더 미국판은 올해 1월 기사에서 주요 네오뱅크들이 대체로 유럽에 있으며 미국에서도 네오뱅크가 곧 핫한 사업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자 은행도 자신들의 롤모델을 몬조(Monzo), 스탈링(Starling), 아톰 은행(Atom Bank) 등 영국의 네오뱅크들로 들었는데요.
사회자: 미국보다 유럽이 금융에서 앞선 사례군요. 이유는 뭘까요?
리포터: 월드 파이낸스 지는 유럽 연합이란 통일된 환경을 꼽았습니다. 독일 N26 은행 같은 경우 5년만에 17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요. 피도르(Fidor) 은행은 2003년 설립되어 40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유럽 연합의 네오뱅크들은 미국으로도 진출 중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이들 네오뱅크는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리포터: 물론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호주 네오뱅크들 보다는 안정적인 것 같긴 한데요. 2015년 설립된 영국 레볼룻(Revolut) 은행은 2017년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 영국 네오 은행 중 처음 손익분기를 넘은 은행이 됐고요. 2014년 설립된 스탈링(Starling) 은행은 2020년에 손익분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기존 은행과는 차이가 나죠.
사회자: 의외네요.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많다보니 고객 확대에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호주에선 예금자 보호법으로 예금자가 보호되긴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긴 하네요.
리포터: 월드 파이낸스 지는 이것이 아직 시장 규모가 작아서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일지는 불명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네오 은행들은 프리미엄 계좌의 계좌 유지비나 보험 상품 판매 등의 커미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은 어떤가요?
리포터: 일단 한국의 경우, 계좌 유지비는 물론, 실시간 이체 같은 건 안됐던 때를 기억하기가 힘든데요. 최근 한국을 가보니 많은 분들이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페이를 쓰고 있더라고요. 줄여서 카뱅, 카페 이렇게 부른다는데요. 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 뱅크는 국민 4명중 1명, 2030 세대의 40%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귀여운 캐릭터들도 인기에 한 몫 하고 있죠?
사회자: 앞서 네오뱅크들의 고민 중 하나가 신규 고객 확보라고 했는데요. 카카오 뱅크는 서비스 오픈 나흘 만에 80만, 165일만에 500만명을, 올해 7월에 천만명을 돌파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네오뱅크 중 최다 고객 보유라고 조사해 오셨는데요.
리포터: 네. 거의 전국민이 카카오톡을 쓰는 한국이기에 가능했던 결과죠. 또 한국이기에 발빠른 천만 고객 돌파 이벤트도 준비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5% 이율의 정기적금 특판, 특정 상품 이자 2배,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사회자: 네오뱅크의 장점이 고객 중심 경험 제공이라면, 한국이 적어도 속도 면에서는 이 분야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하하.
리포터: 카카오톡의 또 다른 한국적 서비스를 보면 모임 통장 기능이 있어요. 각종 모임에서 모임주가 개인 통장을 만들면 멤버들이 같이 회비를 내고,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뱅크 회원이 아니라도 카카오톡이 있으면 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초대도 카카오톡으로 온다고 합니다.
사회자: 아. 그럼 이런 모임들의 단골 골치거리인 회비 안내는 사람이나, 계좌 내역을 밝혀라 뭐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겠네요.
리포터: 네. 심지어 캐릭터 카드로 회비 독촉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인 인증서와 보안 카드도 없어져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최다 주주가 우리은행인 케이뱅크는 공인인증서가 아직 필요하고요, PC로도 사용 가능해서 진짜 네오 은행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최고 2.85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두 은행 모두 해외 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민들도 이런 한국 네오뱅크들에 가입하면 호주와 한국간 송금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나요?
리포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 장벽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한국 신분증도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한국 거주 외국인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거래 본인 인증 시스템에 외국인등록증이 등록돼 있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개선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자: 유럽 네오뱅크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네요. 그럼 한국 분들이 이런 혜택을 위해 해외 네오뱅크에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직구하는 것처럼…
리포터: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카카오뱅크의 처음 두 자리 수의 성장세가 최근엔 한 자리수로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도 문을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중국에서는 텐센트가 투자한 위뱅크가 유명하죠?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마이뱅크도 있고요. 모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텐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와 N26 은행에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핀테크 싱가폴은 아시아의 네오뱅크 업계를 이런 헤드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시아 챌린저 뱅크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 아님” “큰 호응” “네오뱅크의 성장에 필요한 은행 법 보완 필요” “아직 새롭지만 잠재력 충분”
사회자: 좋은 요점 정리인 것 같네요. 오늘은 최신 금융 트랜드인 네오 뱅크와 세계 추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강혜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리포터: 네. 흥미로운 정보가 많아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뤄보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다음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단의 오디오 다시듣기(팟캐스트)를 클릭하시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